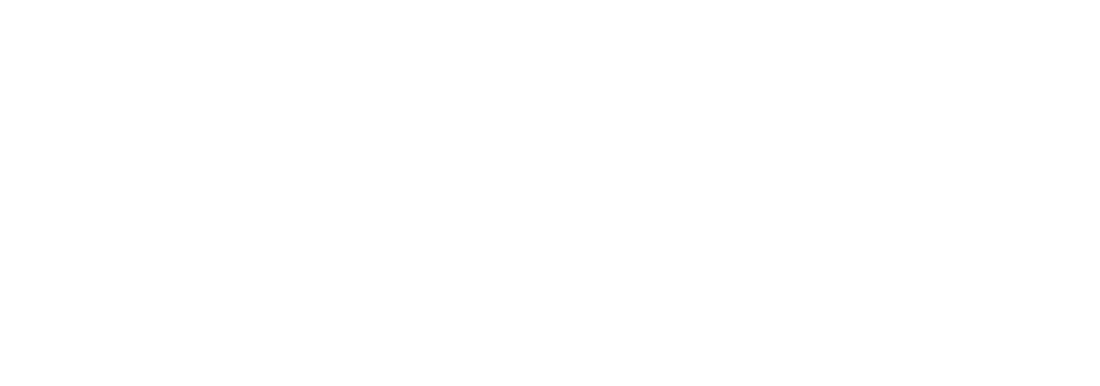021
정세영 〈44〉 리뷰
하상현
 〈44〉 사진 ©Pop Con
〈44〉 사진 ©Pop Con
0. 대기, 반쯤 졸기
정세영 작가는 〈44〉를 보여주기 위해 외진 문화재의 공간으로 관객들을 부른다. 그곳에는 아직, 혹은 영원히 관객에게 장소가 되지 못한(할) 익명의 숲과 나무들이 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기 전 2시간가량을 버스 안에서 보낸다. 이는 문화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흔히 밟는 시간이다. 관객이 밤 동안 이동한다면, 창밖을 보아도 불이 꺼진 간판의 몸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A. 입구
버스에서 내리면, 관객은 어두워진 숲을 본다. 동선은 굴곡이 많고 오르막길로 넘어질 수 있으니, 개인에게 주어지는 원형의 스포트라이트 손전등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발을 비추거나 앞을 비추거나 하며, 관객은 처인성의 전투 소리, 좀 더 가까이서 듣는다면 전투하는 병사들의 목소리 묶음을 듣는다. 이렇게 숲 밖에서 공연의 A 씬은 시작된다. 상관없는 웅얼거리는 목소리와 서사가 관객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관객을 부른다.
B1. 진입
숲은 관객들을 감싸며 자신의 몸체를 바라보게 한다. 관객은 보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췄기 때문에 본다. 앞 잡기 뒤 잡기. 이렇게 보는 행동은 숲속에 산재해 있는 나무와 무덤의 몸체에(때로는 다른 관객의 몸에 무례하게) 백색의 자국을 남긴다. 나무를 비춰보면 익명의 죽은 병사들의 번호표를 달고 있고, 관객은 그것을 뒤에서부터 쫓아간다. 192… 191… 190… 189… 임의의 숫자 잡기는 내가 본 적 없는 사람의 무덤들과 연결된다. 문화재 재건을 위해 옮겨져야 할 무덤. 2017년 12월이 지나도 시신을 옮기지 않으면 무덤은 폐기되며, 관객은 앞에 있는 무덤에 다가갈 수 없다. 물리적인 펜스와 행정절차들, 이것들은 관객의 눈앞에서 무덤과의 거리를 만들거나, 무덤을 지워버릴 것이다.
 〈44〉 사진 ©Pop Con
〈44〉 사진 ©Pop Con
B2. (비)광고
관객이 2와 1까지 따라잡는다면, 숲 중앙에서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백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스크린을 볼 수 있다. 스크린은 본연의 홍보활동을 멈추고 어떤 형상을 보이지 않은 채로, 백색으로 관객을 바라본다. 숲의 중앙을 둘로 가르는 펼쳐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백색, 그리고 관객의 다수의 개별적인 원형의 스포트라이트 백색은 서로를 바라본다. 대부분의 관객은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끄기로 선택한 것 같다. 볼 것은 이미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판은 숲에 놓인 의자를 사용하여 관객석을, 그리고 공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박인다. 이렇게 아무도 스크린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공연의 장막이 만들어진다. 만약 누군가가 백색의 스크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면, 보통의 광고판보다 너무 좌우로 긴 스크린의 몸체로 인해, 시야는 모든 것을 포획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좌우로 흔들렸을 것이다. 조망은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것인가? 정세영 작가는 자신을 지우면서, 혹은 홍보를 지우면서, 그리고 공연에서 의례 있어야 할 법한 요소들을 하나씩 지우며, 채워야 할 빈 체적을 만들어낸다. 관객들은 바닷물이 밀려오는 부피만큼 그 안을 채워야 한다. 그것은 개개인에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서사를 조형하는 행위, 즉 연극일지도 모른다.
A’. 나가기.
〈44〉에서 공연을 나가는 행위는 공연 시작에서 관객을 부르던 처인성 군사들의 목소리와 접합되어 하나의 띠를 만든다. 처음과 끝이 반 바퀴 돌아 이어지는 끈. 이 계속되는 나가기의 행위는 순환하는 연극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44〉에서 회귀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구체적인 (빈)역사가 관객의 몸을 통해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며, 서사를 만들고 수정해 내는 촉각적인 과정이다. ![]()
정세영 〈44〉
2017.10.21.(토)-10.22.(일)
처인성
기획전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2017.10.20.(금).-11.3.(금)
따복하우스 홍보관 발코니, 처인성, 죽전야외음악당
기획 김정현
참여작가 송주호, 정세영, 최해리
그래픽디자인 사슴그래픽(김보라(Violet Kim))
사진 PoP Con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용인문화재단,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