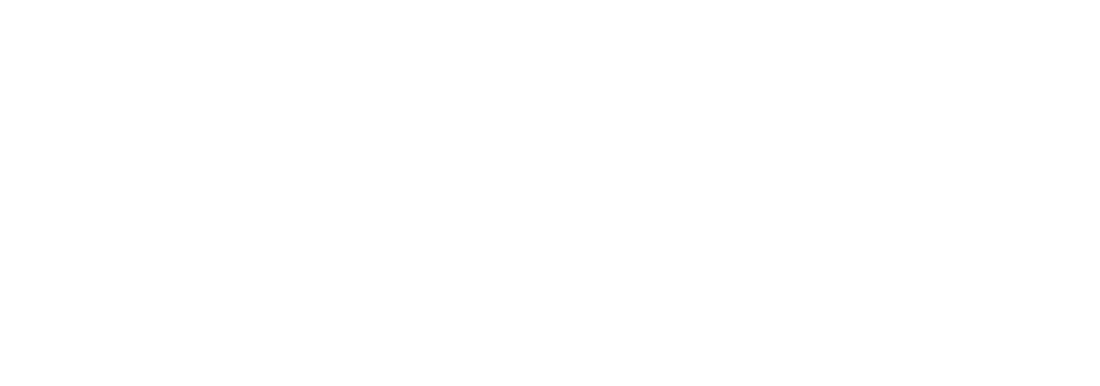008
구멍 난 몸, 드나드는 춤: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불온한 춤을 지속하는 법1*
하은빈
*이 글은 2023 국립현대무용단 아카이브북 『카베에: 언/아카이브』에 수록된 글입니다.
null에서는 하나의 공연을 주제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글을 비교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null의 멤버들(조형빈, 하상현, 하은빈)이 비평으로 참여했던 『카베에: 언/아카이브』의 세 개의 글을 싣습니다.

황수현 〈카베에〉 © 박수환, 국립현대무용단 제공
〈카베에(caveae)〉의 몸들을 바라보며 구멍 난(porous) 몸들을 떠올린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감염병의 시대를 지난 우리 모두가 얼마쯤 배운 사실이었으니까. 우리가 무수한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 몸은 분명하고 단단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명확히 경계 지어지거나 들어찬 존재가 아니라 무수한 빈 공간들이어서, 그 사이로 공기가 들고 나며 끊임없이 무언가와 접촉하고 뒤섞인다는 사실.
신시아 시어(Cynthia Sear)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춘 “우리 몸의 다공적 본질”에 관해 이렇게 썼다. 우리 몸이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분명한 경계를 가진 일종의 보호막”이라는 관념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지각하는 신체의 범위를 즉자적인 살과 피부 너머에서 새로이 상상”하는 일이라고.2 그의 말을 인용하며 박종주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언제나 외부 세계를 우리 몸속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 역으로 몸속에서 생성된 것을 언제나 외부로 배출하고 있음을 – 잊을 수 없게 만든다”.3
이들이 적었듯 감염병은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몸을 지녔다는 것은 구멍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뚫려 있다는 것은 그 틈으로 무엇인가 우리 몸을 오간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롭고 유독한 것들을 옮기고 매개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고 불결하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이기도 했다. 요컨대 출입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었다. 구멍은 우리의 결함이었다.
*
〈카베에〉에 출연하는 서른아홉 개의 몸들을 하나로 꿰는 것은 바로 그런 구멍들을 연결하는 소리다. “아-“였다가 “오-“가 되는, 이내 “희-“이거나 “흠-“이거나 “이-“로 변화해 가는, 입이라는 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소리. 그 높고 낮은 소리들이 바로 이 몸들을 일으키고 조우하게 하고 걷거나 눕거나 달리는 등의 모든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리다. 몸들은 다른 몸들로부터 전달되는 그 진동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진동을 빚어 응답한다.
무대 위 몸들은 부유하는 내 연상 속에서 자주 장면들을 이루었다. 솟고 무너지고 구르는 돌들, 소용돌이치는 물고기들, 엉키고 뒤집히고 겹치는 꽃잎들, 어디론가 떠나는 쪽배들, 이곳저곳에 엎어져서 우는 사람들을 상상했다. 그 어떤 장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몸들이 관계하는 소리의 역학이 끊임없이 바뀌었던 까닭이다. 잠시 만들어진 광경 바깥으로 몇몇 몸들이 돌출하면, 이내 나머지 몸들도 다르게 뒤척였다.
구멍 난 몸들이 있었던 한편으로 그 사이를 드나드는 춤이 있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나 낙엽의 모습에서 바람의 모양이 보이듯 그 춤의 윤곽은 구멍을 한껏 열고 진동과 소리에 스스로를 내맡긴 이 몸들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침범당하고 또 침투하는 몸들, 열어젖히고 넘나들며 능동적으로 서로가 ‘되어가는’ 몸들. 끊임없이 피부의 틈새로 타인을, 세계를 빨아들이고 또 외부로 배출하는 몸들. 춤은 그 몸들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무너지고 도약하고 흘러 다녔다. 밀치고 부서지고 각축하고 구부러졌다.
그런데 이 몸들의 공동체, 이들의 ‘함께 있음’이 발생시키는 춤은 무엇의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서, 차 있음이 아니라 비어 있음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구멍에서 비롯하는 사태다. 〈카베에〉의 몸들이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응답하고 춤출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구멍이라는 없음, 그 부재의 자리 때문이다. 지금껏 세계가 팬데믹에 대처해온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멍을 한계로 인식하게끔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짐으로써만, ‘거리 두기’함으로써만 공동체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를 지속하려는 사회가 도출해 낸 결론이고 합의였다. 그러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지어진 이 공연은 몸들을 매개하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몸의 구멍을 가로지르는 소리와 진동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카베에〉의 안무가 황수현은 썼다. “춤을 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몸들이 만나 조율하고 적응하고 변형되어 가는 과정, 결국 자신의 생각과 몸을 바꿔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사람들이 작품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극장을 넘어, 이제는 “무언가가 통과하고 흘러넘치는 투과성을 지닌 공간으로서 극장을 사유”한다고.4
그가 말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것으로서의 춤추기”를, 혹은 “돌봄(care)”5의 몸짓을 나는 우리의 없음에, 구멍에, 결여에 기반한 움직임으로 읽는다. 말하자면 〈카베에〉는 우리의 구멍 난 몸과 그 구멍을 드나드는 춤이, 우리가 가진 한계나 불능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몸의 다른 가능성 내지는 새로운 역량일 수 있음을 보인다.
*
한편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마냥 아름답고 안전하며 평온하고 깨끗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청결과 위생에 대한 욕망으로 몸을, 구멍을, 공동체를 통째로 멸균하는 일이리라. 이는 지금의 세계가 몸들을 관리하고 통치해 온 규범이나 질서와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뭉치고 뒤얽히고 포개지는 〈카베에〉의 몸들로부터 돌들이나 꽃잎, 쪽배뿐만 아니라 거친 난교를, 무자비한 대학살의 풍경을, 흡사 지옥도를 연상시키는 아비규환의 참사를 연상했다.
어쩌면 구멍 난 몸들인 채로 서로의 틈에 출입하는 일이란 애당초 오염이나 감염에, 원시와 혼돈에 더 가까운 과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구멍으로 드나드는 것은 비단 숨과 진동과 춤과 사랑만이 아니라, 땀과 침과 병균과 냄새이기도 할 테다. 누군가는 그것을 난잡하고 문란하다고, 더럽고 해롭다고 힐난할 테다.
에이즈 활동가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문란한 사랑을 계속하는 법」이라는 글에서 세이프 섹스를 동성애자 운동의 유의미한 발명이자 성취로서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그들은 우리의 문란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우리의 문란이야말로 우리를 구할 것이다.“6 단호한 태도로 에이즈에 대한 도덕주의적 견지의 꾸지람에 맞선 그의 말은 오늘날 다른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크림프의 급진적인 단언을 빌려와, 감염병의 시대에 춤을 지속하는 법을 다시 생각한다. 구멍이 난 몸을, 벌어진 사이를, 헐거운 틈을 결핍이나 유한성, 한계와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을 떠받치는 조건으로서 사유하는 춤. 그 춤은 분명 난잡하고 문란하며 불온할 테다.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것들과 함께 교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연하고 약하고 무른 부분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사랑을 닮았다.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무력한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 본다는 점에서 용기를 닮았다.
*
처음에는 조도가 낮다 못해 캄캄하다시피 했던 무대는, 그러나 몸들의 관계가 역동함에 따라 점차 희붐하게 밝아졌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웠으므로 객석의 몸들도 덩달아 함께 밝아졌다. 해오름극장에는 분명 무용수의 몸들뿐만 아니라 그 무용수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이따금 미약한 움직임이나 기척을 내는 다른 관객의 몸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춤을 목격하는 관객 또한 그러한 ‘문란한 돌봄’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실은 관객이야말로 서로에게 항상 미지의 소리를 흘려보내고 또 서로의 신호를 전해 듣는 가장 가까운 몸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객으로서, 서로에게 희미하게 깜빡이는 신호로만 존재하는 또 다른 관객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리에, 서로를 모르면서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가?
떨리는 입술, 뜨이고 감기는 눈. 그 사이로 들고 나는 소리와 숨과 춤. 그들의 진동에 넓고 깊고 높은 극장이 조용히 공명하고 있었다. 구멍과 구멍 간의,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이 때로 영원처럼 길어 덩달아 숨을 죽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기척이 일었다. 그 떨리는 틈새들을, 모르는 삶을 향해 열리고 닫히는 구멍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
1 이 글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신문 5월 호 연극비평 란에 기고한 원고 〈구멍난 몸, 드나드는 춤〉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부제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불온한 춤을 지속하는 법’은 본문에 인용한 더글라스 크림프의 글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문란한 사랑을 계속하는 법」을 변용한 것이다.
2 Cynthia Sear, “Porous Bodies: Corporeal Intimacies, Disgust and Violence in a COVID-19 World”, Anthropology in Action 27(2), 2020, p. 74.
3 박종주, “팬데믹, 몸의 경계. 그리고 퀴어연극,” 『한국연극교육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포스트 팬데믹과 뉴 노멀 시대의 연극교육 2. 환경, 젠더, 인종, 퀴어와 연극』, 서울, 2021, p. 2. 이 글에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몸의 다공성에 관한 아이디어는 이곳에서 얻었다.
4 황수현, 「안무가의 글」, 〈카베에〉 프로그램 북, 서울: 국립현대무용단, 2023, p. 5.
5 〈카베에〉 프로그램 북에 실린 「리서치 아카이브」에 따르면, 돌봄(care)은 스케일(scale), 에코(echo)와 함께 〈카베에〉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언더스코어, 「리서치 아카이브」, 위의 책, p. 1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