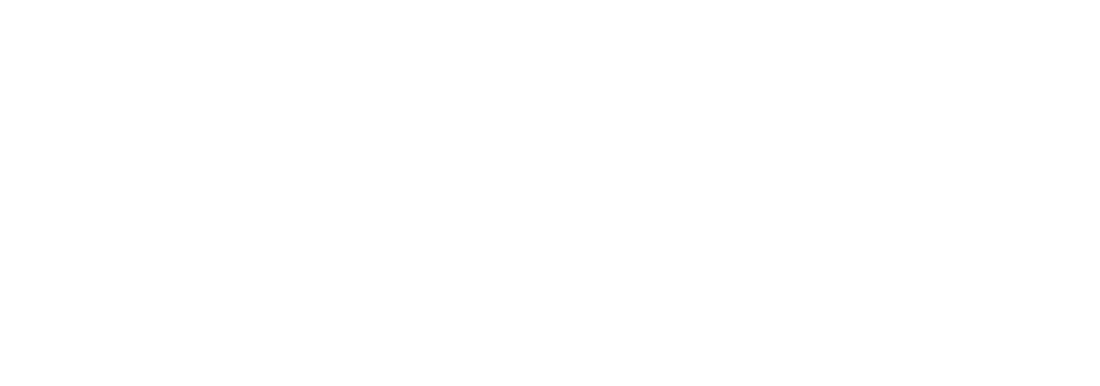『연극in』 폐간에 반대하는에디토리얼 콜렉티브 널 성명서
『연극in』은 누구의 것인가?
2025년 6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연극센터에서 발행하는 웹진 『연극in』의 ‘잠정 휴간’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2022년 서울무용센터의 웹진 『춤in』 휴간 사태가 그러했듯, 『연극in』의 ‘잠정 휴간’ 조처는 결국 구체적인 복구 계획 없는 영구 폐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디토리얼 콜렉티브 널’은 『춤in』에 이어 『연극in』까지 이어진 공공 매체의 일방적 폐지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재단은 휴간의 이유로 ‘예산 삭감’과 ‘발간 매체 재점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넘게 역사를 이어온 『연극in』은 중단하는 마당에, 새로 개설하는 포털사이트 ’스파크’(SPAC)에 예산을 배정하는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매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밝히지 않으면서, 재단 지원사업 선정작들을 홍보하고 비평하는 포털사이트의 오픈을 함께 홍보하는 몰염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춤in』의 휴간 이후 지금까지 ‘재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전례를 생각해 볼 때 『연극in』의 ‘잠정 휴간’이라는 표현 역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예술계 주체들이 주도하는 비평 담론장에 대한 의도적인 제거, 즉 기관이 손쉽게 관리/통제 가능한 매체만을 남기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간 웹진 『연극in』은 한국 연극계의 실천적 비평장이자 연극의 존재 이유를 사유하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들은 리뷰를 통해 오늘날 한국에서 올라가는 논쟁적인 연극들을 첨예하게 다루어 왔고, 운영진들은 매 차례 기획 기사로 동시대 연극계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질문을 앞서 던지며 비평적인 담론장을 형성했다. 창작자들은 『연극in』을 통해 무대 뒤로 쉬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보존했으며, 관객들은 열린 공론장을 부단히 오가며 감상을 기록하고 서로 대화했다. 이렇듯 다양한 목소리로 『연극in』을 꾸리고 채워온 이들 모두가 지금 우리의 연극계를 형성해 온 연극인들이다. 재단이 중단하고 지우려 하는 것은 이 모든 연극인들의 존재와 목소리다.
시민이 오랫동안 만들고 나눠온 목소리는 특정 기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민 공중(公衆)의 자산이다. 서울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실행해 온 매체 짓누르기는 시민의 자산을 약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공론장을 억압하고 빼앗아 가는 작금의 실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면서 정작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묵살하고 소외하는가?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하겠다면서 예술가와 관객이 십여 해에 걸쳐 지어온 공론장을 이토록 간단히 일소하는가? 재단이 꿈꾸는 바람직한 공공 매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모든 연극인들의 자리가 없는 표백된 매체, 불편한 목소리는 소거되고 문제의식은 소멸한 매체, 그것은 공공의 매체가 아니라 권력의 매체다.
재단에 묻는다. 『연극in』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연극in』은 관객의 것이다. 독자의 것이다. 예술가와 비평가의 것이다.
무대의 것, 객석의 것, 현장의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연극인들의 것이다.
『연극in』을 연극인에게 돌려달라.
공론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
서울문화재단은 『연극in』 ‘잠정 휴간’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연극in』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열고 현장과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공공매체에 대한 일방적인 폐간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연극in』의 발행을 재개하라.
『연극in』을 비롯하여 『춤in』, 서교예술실험센터, 예술청 등 예술가 협치형 플랫폼의 복원을 재검토하라.
2025년 6월 22일
에디토리얼 콜렉티브 널
권태현 라시내 이민주 이혜령
조형빈 하상현 하은빈 한수민